‘황폐화 원흉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벗고
새롭게 보는 한국 근대 임업의 변천
전근대 시대에 나무는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연료, 국방과 건축을 위한 재료, 제염 등 산업을 위한 동력이었다. 이 책은 그런 나무를 심고, 키우고, 활용하는 임업에 초점을 맞춰 한국 근대 경제사의 주요한 변모를 추적한 것이다. 지은이는 산림 소유권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역사학자. 그는 탄탄한 조사와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일제가 한국의 산림자원을 수탈해 갔다거나 일제의 정책이 한국 임업의 근대화 기반을 닦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한국 근대 임업사를 제대로 보는 시각을 제공한다.
한반도 산림 황폐화는 조선 후기부터
지은이에 따르면 일제가 조선의 산림을 헐벗게 만들었다는 것은 과장이다. 이미 조선 후기에 한반도의 산야는 황폐했기 때문이다. 관찬 사료에 “관서 연로의 모든 산이 민둥산이 되었다”(38쪽)라든가 “조선총독부의 1910년 조사에서 산림의 68% 정도에 쓸 만한 나무가 거의 없었다”(85쪽)는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19세기 조선 순조 때 한양 사람들이 땔감을 구할 길이 없어 빈 궁궐(경복궁)의 전각을 허물어 그 목재를 가져다 연료로 삼았다는 기사(78쪽)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병선 및 조운선의 선재船材, 소금 생산 및 온돌의 확대, 화전 개간의 성행 등 탓이었다. 여기에 유명무실한 송금松禁정책 외에는 체계적인 식목계획이나 대체연료재 개발 등 제대로 된 임업 정책의 부재가 부채질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전에 조선의 산야는 위기상황이었다.
일제가 내세운 ‘문명적 임업’의 기만적 실상
조선총독부는 산림 황폐화가 소유주가 없는 탓이라 파악하고, 산림 소유권을 확정하는 임야조사사업을 임업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에 더해 금벌주의 정책이라 하여 소유지 입산 자체를 금지하고는 이를 ‘문명적 임업’이라 규정했다(48쪽). 그러나 1911년 조사에선 소유권 신고가 전체 임야 면적의 15%도 이뤄지지 않았고(159쪽), 그 외 ‘국유림’에선 일제가 만든 영림서와 일본 대기업에서 수익을 뽑아갔다. 또한 벌채량과 식목량의 균형을 뜻하는 ‘보속성의 원칙’을 지키지도 않았고, 조림은 산주의 책임이 되었으며 사방사업 등 산림녹화에 공공재정을 투입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1930년대 후반 들어 중일전쟁 확전 등으로 전시체제가 들어서면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 강변하는 등 정책 일관성도 없었다. 요컨대 정책 입안 및 실행 능력도 떨어진 데다 제국주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으니 식민지 근대화론은 허구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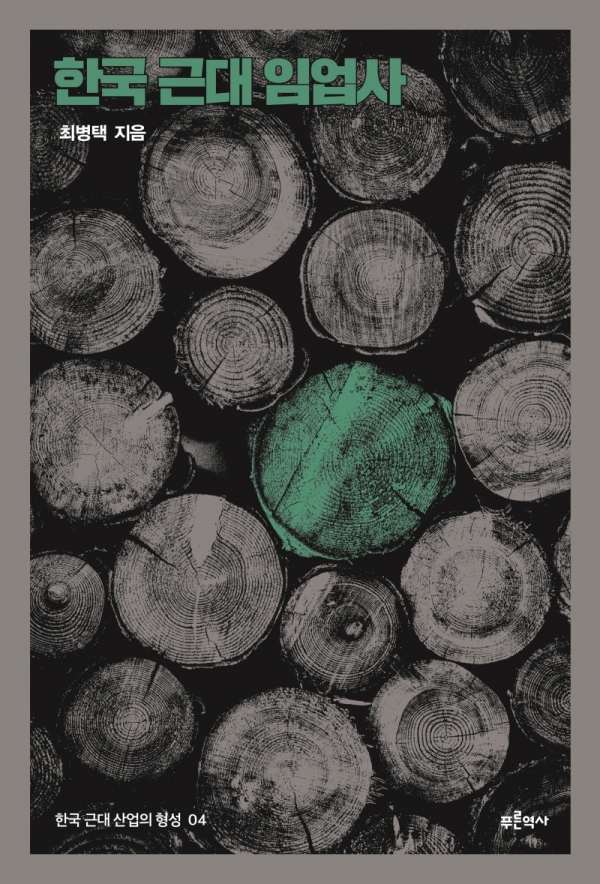
탄탄한 자료조사, 설득력 있는 해석
지은이는 다양한 사료를 뒤져내 근대 임업의 변천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실록, 《비변사등록》,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보고서》 등 조선과 조선총독부의 공식 자료를 동원한 것은 기본. 여기에 조선 후기 땔감난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은진강경고민등의송〉 등 규장각문서, 1930년 함경남도 단천군에서 삼림조합의 횡포에 반발해 일어난 시위 사태를 다룬 《조선일보》 등 풍부한 보조 자료를 섭렵해 실상을 제대로 전한다.
여기에 일제가 망국수亡國樹로 꼽은 소나무가 조선의 으뜸 수종樹種이 되어야 했던 배경이나 산림 소유권 부재로 인한 부작용 등을 풀어가는 지은이의 시각이 책의 가치를 더한다.
역사를 읽는 재미 중 하나는 과거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과거를 딛고 선 것이기에 이는 미래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미덕은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알려주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번역 제공
번역 제공

